세상일의 좋고 나쁨은 일괄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어떤 일을 겪더라도 인생은 ±0(플러스마이너스 제로)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악을 듣는다"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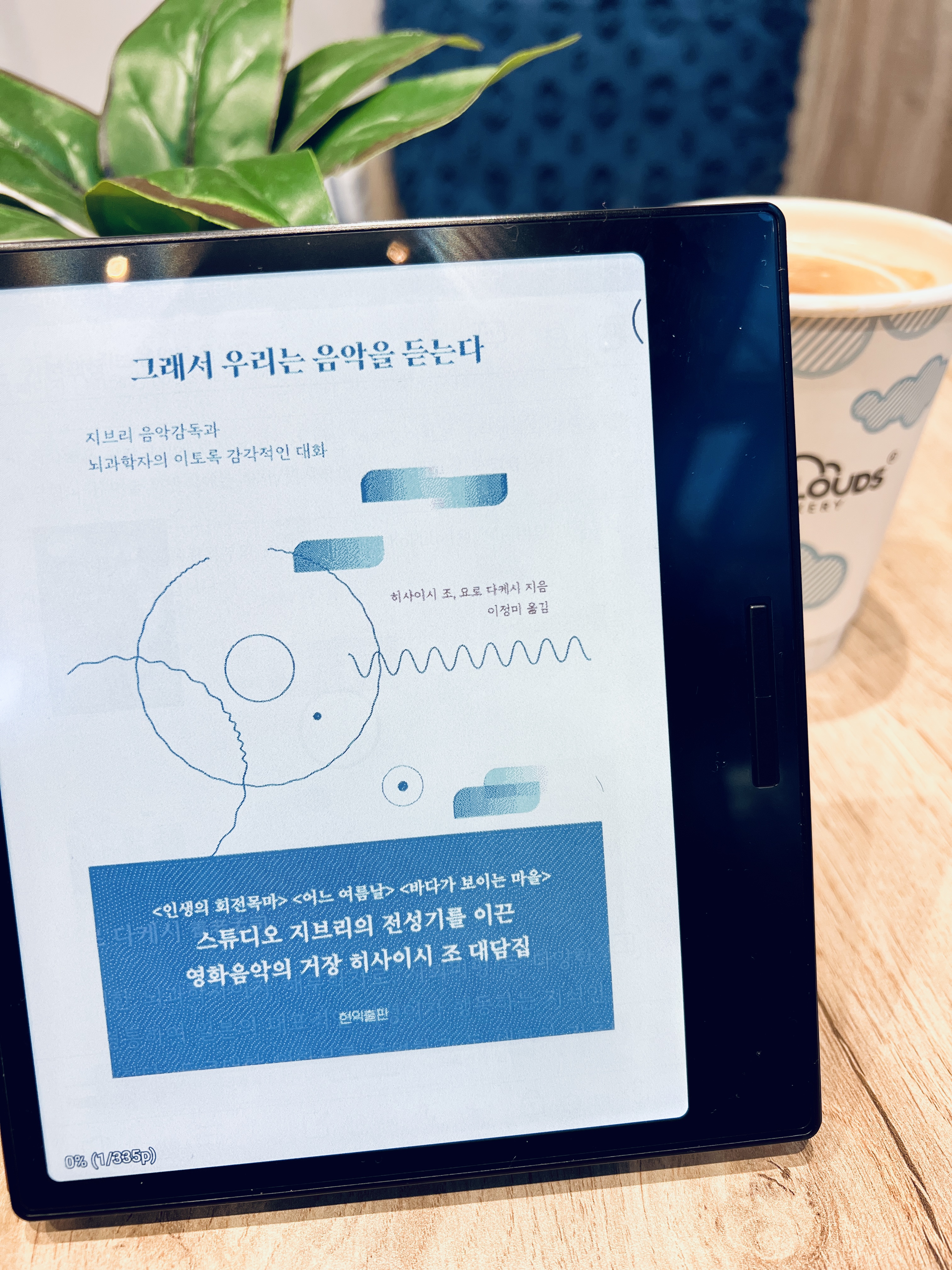
이 책은 히사이시 조와 요로 다케시의 대담집이다.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는 인간의 감각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감각이 이룬 언어와 사회 그리고 현대사회의 변화까지 이야기가 흘러간다.
이동진 님께서 작년 이 책을 자신의 유튜브에서 추천하셨던 책이다. ’ 히사이시 조‘라는 이름만으로 이미 내 마음은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 히사이시 조‘ 그리고 ’ 이동진‘ 이 두 분의 조합만으로도 이 책을 읽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히사이시조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인물은 일본의 뇌과학자이자 해부학자인 요로 다케시로 일본의 대표적인 지성이자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손꼽힌다고 한다. 음악인과 뇌과학자라는 너무 다른 두 지식이 만나서 대화는 더욱 풍성해지고 밀도가 높아진다.
“도시 사회는 더러운 것과 냄새를 싫어하는데 무균, 무취에서는 생명이 살 수 없다는 것. 냄새에 대한 혐오는 결국 차별과 직결되기에 경계해야 한다.”(냄새라는 감각과 무취사회 중에서)”
인간의 감각에 대한 대화들 중에서 냄새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한 감각을 넘어 그로 인해 우리가 갖게되는 인식의 변화를 지적한다.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사회에서는 냄새는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는 요소이다. 냄새는 원초적인 감각이다. 원초적 감각은 즉각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기 때문에 도시속에는 수많은 인공의 냄새들이 가득하다. 식욕을 돋우는 냄새, 편안함을 느끼게 만드는 냄새 등 우리는 디자인 된 냄새 속에서 감각의 휘둘리며 살아간다. 반면 불쾌한 냄새는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고 냄새의 혐오를 표출하고 사람의 차별한다.
요로 다케시의 지적이 더 날카롭고 서늘하게 느껴졌다. 주관적인 감각으로 객관적 사실과 상관없이 우리는 현상을 회피하거나 차별한다. 이러한 반응은 본능적으로 움직인다. 하지만 감각으로 인한 인식의 오류 혹은 차별을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나는 얼마나 많은 차별을 무의식 속에서 쌓아가고 있는지를 묻게 되는 글귀이다.
<결이 맞는다>는 표현은 사물과 사람에게 모두 존재한다. 개개인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것, 감촉이란 자신과 대상의 거리감을 파악하는 척도처럼 느껴진다(히사이시)
<개성은 몸에 있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감각이 점점 둔감해지고 몸이 잊히는 상황에서 ‘개성의 표현’이라 ‘나다움’이라는 말은 의미를 갖기 어렵다 (요로)
(개성은 몸에서 비롯된다 중에서)
요로씨는 현대 사회에서 감각이 점점 둔감해지는 이유 중에 콘크리트 재질의 질감으로 이루어진 건물들이 늘어나면서 질감이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 실외 난간을 금속으로 만듦으로 날씨에 따라 손에 닿는 촉감이 좋지 않다는 경험을 이야기한다. 기능만을 중시하다 보면 손길을 거부하는 사물들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감각이 둔감 해지는 현상으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또한 언어를 기반으로 인간은 언어가 통용되는 세상을 만들었고, 그 결과 ‘도시’가 만들어졌다. 도시는 인간의 뇌, 즉 의식이 만든 존재이다.
이를 요로 씨는 ‘뇌화 사회’라고 말한다.
요로씨는 이러한 사회에서 지식이라는 형태로 갖춰지지 않은 것,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사람들의 감각 자체가 둔해지고 있다고 말한다.
감각이 둔해지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자연에서 점점 멀어지고, 마주 보며 이야기하는 것보다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는 것이 편안해지는 사회에서 우리는 자연으로서의 원초적 감각이 점점 둔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도시 안에서는 새소리, 바람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를 잘 듣기가 어렵다. 또한 자연물의 촉감 역시 닿기가 어려운 환경이다. 이러한 감각의 둔화는 우리의 감정의 둔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일어났다.
이 책은 ‘알쓸신잡’의 일본 편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듯하다.
두 어른의 대화는 그들이 단순히 자신만의 직업에 몰두하는 사람이 아닌, 세상에 대한 관심과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끝없이 고민하고 세상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이 가득하다.
감각으로서의 음악과 인간의 의식과 말에 대한 이야기. 공감과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인간의 뇌에 대한 지식과 문화에 대한 통찰까지 쉴 틈 없이 쏟아진다.
이런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고 감사했다.
나는 이런 어른들처럼 물들어 가고 있는지를 잠시 멈춰 서서 고민하게 된다.
'삽질하는 힘을 키우는 중입니다(책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 지랄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 조승리 에세이, 달 출판사: 덤벼라 세상아! (3) | 2025.01.20 |
|---|---|
| <소설 페인트> 이희영, 창비청소년 문학상 수상작 : 삶을 내 손에 꽉쥐고 휘둘리지 말기 (0) | 2025.01.09 |
| 소설 <빛이 이끄는 곳으로> 건축가 백희성, 북로망스 : 공간은 추억과 사랑으로 비로소 완성된다. (0) | 2025.01.06 |
| 소설집 <깊이에의 강요> 파트리크 쥐스킨트, 열린책들 :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말것 (3) | 2024.12.02 |
| 단편소설집 <대성당> 레이먼드 카버, 김연수 옮김, 문학동네 : 에피파니의 순간 (2) | 2024.11.27 |



